도연명과 이태백
- Stories.../주저리주저리...
- 2007. 11. 18. 10:53
도연명과 이태백
*

도연명(陶淵明. 365~427)은 약 1600여년전의 중국 사람이다. 도연명 혹은 도잠(陶潛)의 자는 원량(元亮이)이고, 동진(東晋)과 송(宋) 때의 심양(尋陽) 시상(柴桑) 사람이다. 그는 전원과 술을 벗 삼아 살아간 중국의 유명한 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문화예술의 독보적 역할을 한 것은 불교였다. 동진의 중 마라나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한 것이 384년인데, 이때 도연명은 20세였다.
도연명은 29세 때 벼슬길에 나갔다. 관리생활을 하다가 곧 그만 두었다. 그러나 집안이 어려워 친지의 천거로 나이 40세 경이던 405년에 다시 관직에 나아가 팽택현령(彭澤縣令)을 맡게 되었다. 이때가 동진(東晋) 시대였다. 도연명은 현령이 된지 80여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그가 관직을 그만 둔 이유는 틀에 박힌 공직생활과 아부 굴종해야 하는 벼슬아치의 생활이 성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기록에 전하는 바와 같이 도연명은 “다섯 말의 쌀(五斗米)을 얻기 위해 향리의 소인(小人)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하여 현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고향인 여산 서남쪽의 시상에 은거했다. 이와 다른 얘기도 있다.
그가 관직을 떠난 이유는 누이동생이 죽어서 상사(喪事)에 가기 위함이었다고도 한다. 어쨌든 이렇게 물러난 현령 자리에 그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도연명은 손수 농사를 지으며, 가난과 병의 고통 속에서도 친구들과 술을 나누면서 우리가 보기로는 전원에서 낙천적 생활을 했다. 그는 62세 경에 죽었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 죽을 때까지의 시기(405~427)는 한반도에서 고구려 광개토왕 · 장수왕, 신라 실성왕 · 눌지왕이 왕위에 있던 때이다.
도연명이 관직을 버리고 귀향할 때의 심정과 그 뒤 어지러운 세상을 잊어버리고, 전원생활에 만족하는 내용을 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귀거래사(歸去來辭)다.
< 귀 거 래 사 >
歸去來兮 田園將蕪胡不歸(귀거래혜 전원장무호불귀)
나 이제 돌아가리니 전원이 황폐해지려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생략)...........
引壺觴以自酌 眄庭柯以怡顔(인호상이자작 면정가이이안)
술 항아리와 잔을 들어 마시고, 정원의 나무를 지그시 보며 미소 짓는다.
...........(생략)...........
世與我而相違 復駕言兮焉求(세여아이상유 복가언혜언구)
세상은 나와 맞지 않으니, 다시 벼슬에 오른들 무엇을 더 구할 것인가.
...........(생략)...........
富貴非吾願 帝鄕不可期(부귀비오원 제향불가기)
부귀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신선이 사는 곳은 내가 바랄 수 없는 일이네.
...........(생략)...........
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요승화이귀진 낙부천명복해의)
얼마동안 자연의 섭리를 따르다가 죽어 가면 그만, 천명을 누렸거늘 다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 挽 歌 詩(만가시) >
有生必有死(유생필유사)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니
早終非命促(조종비명촉) 일찍 죽는 것도 운명이 아니겠는가.
昨暮同爲人(작모동위인) 어제 저녁에는 다같이 사람이었다가
今旦在鬼錄(금단재귀록) 오늘 아침에는 저승에 있네.
魂氣散何之(혼기산하지) 혼은 흩어져 어디로 가버리고
枯形寄空木(고형기공목) 마른 몸만 관속에 들어가 있는가.
嬌兒索父啼(교아색부제) 아이들은 아비를 찾으며 울부짖고
良友撫我哭(양우무아곡) 친구들은 나를 잡고 곡하는구나.
得失不復知(득실불복지) 이제는 이해득실 알지 못하니
是非安能覺(시비안능각) 시비인들 어찌 알 수 있겠는가.
千秋萬歲後(천추만세후) 천년만년이 지난 먼 훗날에는
誰知榮與辱(수지영여욕) 영화나 치욕을 그 누가 알기나 하겠는가.
但恨在世時(단한재세시) 단지 한스러운 일은 살아 있을 때
飮酒不得足(음주부득족) 마음껏 술 마시지 못했음이라.
우리의 삶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짧은 순간을 지나가면서 그 짧은 시간을 초, 분, 그리고 시로 나누고. 또 일(日)이다, 월(月)이다, 연(年)이다 하며, 시간에 매듭을 지어 구분하는 습관에 익숙하다. 이것은 무한한 시공 속에서 보면, 한낱 부질없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가 이를 깨닫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도연명이 자기의 죽은 뒤를 상상하고, 글까지 남겼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차분한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에서 느끼는 자유, 즉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 상태였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

술과 시를 얘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시와 술에 있어서 인간이면서도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시선 · 주선 이태백(詩仙·酒仙 李太白. 701~762)이 바로 그 사람이다.
태백은 자이며, 백(白)은 이름이고,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다. 중국 당 나라 때의 시인이다. 이백은 자신을 스스로 적선(謫仙), 즉 “신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상으로 쫓겨 온 신선”이라고 했다.
같은 시대의 시성(詩聖) 두보(杜甫)는 이백을 주중선(酒中仙)이라 불렀다. 이태백의 시는 약 1천여 개가 넘게 전해지고 있다.
이백이 살던 시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였다. 불국사가 세워진 때이고,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가 만주 지역에 있던 시기였다. 이백은 신라의 명승 혜초(704~787)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다. 이백이 태어난 때는 황룡사9층탑이 세워진지 57년째 되는 해였고, 경주에는 이 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있었다. 이태백이 그때 경주에 왔었다면 틀림없이 황룡사9층탑에 올라가 역사에 길이 남을 시를 한 수 남겼을 것이다. 조금 아쉬운 일이다.
이태백은 앞에서 본 도연명보다 약 300년 뒤의 사람이지만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다. 모두 술을 좋아했고, 청소년 때는 자유분방하고,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모두 60세가 조금 넘어 이 세상을 떠났고, 세상이나 사람들을 크게 원망하지 않았다.
평범한 눈으로 보면, 두 사람은 모두 말년이 행복하지는 못했고, 생활도 풍족하지 못했으며, 좀 소외된 삶 속에서 외로웠을 것 같다.
남성적인 것을 사랑했던 이백. 그는 25세 때 그가 태어난 곳으로 짐작되는 촉 땅을 떠나 양자강을 따라서 강남 · 산동 · 산서 등지를 돌아다녔다. 젊어서 도교에 심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산속에서 오래 보냈다.
이백의 시에서 약간 환상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은 대부분 도교적 발상에 의한 것이 아닐까. 산은 이백의 시 세계의 중요한 무대이기도 하다. 그 의미가 마음에 전달되는 듯 마는 듯, 알듯 모를 듯한 다음의 시는 그 무대가 산이다.
< 山中問答(산중문답) > : 산속에서 묻고 답하다
問余何意棲碧山(문여하의서벽산) 왜 산에 사느냐고 묻는 말에
笑而不答心自閑(소이부답심자한) 대답 대신 웃는 심정 이리도 넉넉하네.
桃花流水?然去(도화유수요연거) 복사꽃 물에 흘러 아득히 가니
別有天地非人間(별유천지비인간) 인간 세상 아닌 다른 세상이어라.
이백의 죽음도 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말년에 병약하여 친척 이양빙(李陽氷)에게 의지하다 병사했다는 주장은 평범하다. 반면, 장강에서 뱃놀이를 하다 크게 취하여 강물 위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익사했다는 것은 멋을 더해 준다. 아무래도 달을 잡으려다 익사한 죽음이 더 매력을 주는 죽음이 아닐까...
이백은 술을 퍽 좋아했던 것 같다. 그는 하루에 300잔, 100세까지 살면서 3만6천 날을 매일 그만큼 마실 계획이었으니 술과 벗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삶이었다. 그는 이런 생각을 양양가(襄陽歌)에서 시로 빚어냈다.
술 한 말을 마시고, 시 100편을 썼다는 그의 주량은 어느 정도였을까? 아마 “300잔이다”, “말(斗)이다”하는 것은 중국풍(中國風)으로서 과장된 표현일 것이다. 이태백이 술을 많이 마신 애주가임에는 틀림없겠지만, 그가 마신 술이 알코올의 도수가 매우 높은 술이 아니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인간의 위장이 원래 독한 술에 익숙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백은 월하독작(月下獨酌)이란 시에서 “술 석 잔이면 큰 도(大道)에 통하고, 한 말이면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읊었다. 술과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고, 그에 몰입되어 가는 이백의 모습에서 방랑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우수에 젖은 한 인간의 외로운 참모습을 보는 듯하다.
달밤에 홀로 술잔을 들면서도 자신과 달과 그림자 셋이서 술상을 벌였다고 생각한 이태백... 우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던 착상에 감탄하면서도 적막강산 같은 기분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다.
하나라 우 임금은 , 술은 자신을 망치고 , 나라를 망친다고 하면서 한번 마셔 본 후 다시는 입에 대지 않고 멀리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태백은 술로 말미암아 자신을 망친 경우일까, 아니면 신선 같은 경지에 도달하여 인간으로서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승화된 삶을 보낸 경우일까...?
이태백은 이에 답한다.
“술에서 얻는 즐거움을 깨어 있는 이에게 전하려 말라.”
< 月下獨酌(월하독작) 2 > : 달밤에 혼자 술을 들다
天若不愛酒(천약불애주) 하늘이 술을 즐기지 않았다면
酒星不在天(주성부재천) 하늘에 주성이 있을 수 없고
地若不愛酒(지약불애주) 땅이 술을 즐기지 않았다면
地應無酒泉(지응무주천) 땅에 어찌 주천이 있겠는가.
天地旣愛酒(천지기애주) 천지가 이미 술을 즐겼으니
愛酒不愧天(애주불괴천) 술 즐김이 어찌 부끄러우랴.
已聞淸比聖(이문청비성) 듣기에 청주는 성인과 같고
復道濁如賢(복도탁여현) 탁주를 일러 현인과 같다하니
賢聖旣已飮(현성기이음) 성현을 이미 다 마신 후에
何必求神仙(하필구신선) 신선은 더 구하여 무엇 하랴.
三盃通大道(삼배통대도) 석 잔 술에 큰 도에 통하고
一斗合自然(일두합자연) 한 말에 자연과 하나 되거니
但得酒中趣(단득주중취) 취하여 얻는 즐거움을
勿爲醒者傳(물위성자전) 깨어 있는 이에게 전하려 말라.
< 月下獨酌(월하독작) 1 > : 달밤에 혼자 술을 들다
花間一壺酒(화간일호주) 꽃 사이에 한 병의 술을 놓고
獨酌無相親(독작무상친) 친한 이 없이 혼자 마신다.
擧杯邀明月(거배요명월) 잔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고
對影成三人(대영성삼인) 그림자를 대하니 셋이 되었구나.
月旣不解飮(월기불해음) 달은 본래 술 마실 줄 모르고
影徒隨我身(영도수아신) 그림자는 부질없이 흉내만 내는구나.
暫伴月將影(잠반월장영) 한동안 달과 그림자 벗해
行樂須及春(행락수급춘) 봄이 가기 전에 즐겨야겠지.
我歌月排徊(아가월배회) 내가 노래하니 달은 거닐고
我舞影零亂(아무영영란) 내가 춤을 추니 그림자도 춤춘다.
醒時同交歡(성시동교환) 깨어서는 모두 같이 마시고
醉後各分散(취후각분산) 취한 뒤에는 각자 헤어지는 법.
永結無情遊(영결무정유) 무정한 놀음을 길이 맺었으니
相期邈雲漢(상기막운한) 다음에는 저 은하에서 우리 만나세.
[ 음악 : 대금연주곡 - "한오백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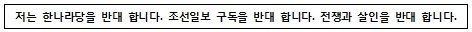
이 글을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