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보고 싶다...
- Stories.../주저리주저리...
- 2007. 9. 24. 15:35

[ 선택 : 소리를 들으실분만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
내가 서 있는 도시
*
오랜만에 서울 도시에 왔다...
경기도 촌놈이 바라 본 도시...
얼마전 까지 살았던 도시지만
이제 이 도시는 화려함 보단 썰렁하다.
많은 빌딩들 속에 또 다시 그 틈을 비집고 새로운 빌딩이 들어선다.
어릴때 부터 얼마전 까지 살아온 도시지만,
내게 이제는 빈 들 처럼 느껴진다.
불 타는 듯 타 오르는 도시...
거리는 불꽃처럼 화려하지만,
이 도시는 내게 정녕 빈 들 이다.
그래서 들에는 온통 먼지 뿐 이다.
왕성한 변화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 비워진 들...
이 들판의 정서는 정녕 고독 뿐 이다...
검은 아스팔트 땅으로 이어져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정작 사람들의 가슴에는 단절과 고독으로 목말라 가는...
내가 자라던 도시의 동네도 상대적으로 변화 되었지만,
그 나마 자라면서 같이 변화한 도시라 그런지
아직은 낮설지 않은 소박함이 조금 느껴질 뿐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도시의 저녁 무렵 하늘에 별을 볼 수 있다면,
그 까만 도화지 위에 그려낸 하얀색 별을 볼 수 만 있다면,
그래서 어릴적 별을 보며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해 낼 수 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도시의 빈 들을 말 하지 않으리...
.....
안면도 바닷가가 보고 싶어 졌다...
물과 뭍의 경계가 뚜렸하게 있고,
물이 사는 바다와 사람이 사는 바다...
그리고 수심 낮은 깊이에 늘 상 돌아가니던 작은 거룻배...
조개껍질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들의 삶과
질퍽한 갯벌의 바닷내음이 어우러져 처절하도록
소박한 생(生)이 존재하는 바다...
지극히 일인칭적인 맹목의 사람이라고 꾸짖어도 좋다.
여름이 지난 가을 바다의 비릿한 바람이 싫다고 해도 좋다.
풍요를 바라고 여유있는 한가위라지만,
기껏해야 시원한 바람만 있고,
물과 뭍이 어우러 사는 곳...
그 바다에 가고 싶다...
이유없이 이유있는 것 처럼...
그냥 바다에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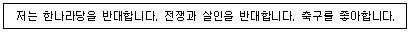
이 글을 공유하기









